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갈구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인간의 손이 자꾸 쥐려고 하는 모양인 것은 그만큼 비우려는 것보다 손에 움켜쥐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배려하려고 두 손을 위로 펴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한사코 손을 접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증명이 되고 있다. 남에게 선의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내 육신이 더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 반란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성프란시스』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사들과 만찬을 즐길 때 음식에 재를 뿌리며 한 말이다. 내 몸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성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인간의 쾌락’에 스스로 재를 뿌리고 있다.
'나무처럼 살아야지 / 나(我) 무(無) / 비우지 않고 무엇을 채우려 하나 // 마지막 잎새 떨군 앙상한 몸 / 비로소 해탈이 가능하거늘 // 버려야지 / 양지에만 있는 심목(心目) / 언젠가는 미혹에 눈멀텐데 // 현혹시키는 뛰어난 재명(才名)에 / 세간 인심 요지부동이나 // 인명재천의 요절은 불시의 일 // 나무처럼 살아야지 / 나무(我無)처럼' 필자의 시 '나무처럼 살아야지'는 비움의 진리를 나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시 ' 나무와 나'에서는 언제나 맨몸인 채 그대로 은근한 소박함이 눈부신 나무와 헐벗은 영혼은 방치한 채 매일 의복으로 치장하는 나를 자책하고 있으며, 아무리 모진 강풍이 몰아쳐도 부러질지언정 부화뇌동하지 않는 나무와 한시도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벼이 떠도는 경망스러운 나를 적나라하게 비교하고 있다.
'나무는 남의 탓을 하지않는다 / 시들어 아스러질 상황에도 / 초록의 꿈을 뒤로한 채 / 홀로 묵묵히 감수하여 / 화석처럼 응달에 침묵할 뿐이다 / 툭하면 제 잘난 듯 / 주위에 원망을 쏟아내는 나는 / 얼마나 이기적인가 / (하략)' 이 시는 곧 초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지금 힘들다고 절망하는 필자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초록도 언젠가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기에 사실은 그 의미도 극히 제한적이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에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왜 나무를 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은혜를 모르는 배신에 치를 떨지도 모를 나무는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또 몸이 베어져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죽어서도 세상에 토막 난 자신의 몸과 더욱 은은한 향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을까. 그렇게 배신은 철저히 인간의 몫이고 전유물이다. 그렇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나무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
'(상략) / 제 자리 가만히 서서 / 그늘 만들어 주던 나무에 / 선(善)으로 위장한 미소로 속 감추고 / 허세 부리던 광인(狂人)이 / 날선 도끼를 연신 찍어댔다 // 나무는 고통에 신음하며 / "맘껏 찍어라 / 그러면 나는 너의 광기에 관용을 보여 주마" // 광인은 찍어도 찍어도 쓰러지지 않자 / 제 풀에 지친 나머지 /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 필자의 시 '나무 찍기'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일침을 가하는 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또한 뜻대로 잘 되었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내일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막연한 예측일 뿐이다. 그저 다 비우고 덤덤하게 살아갈 뿐이다. 내일이면 날선 도끼와 전기톱에 허리가 잘리울지도 모르는 나무도 저토록 의연하지 않은가.
불교에서의 무(無)와 유교에서 무위(無爲)는 변화와 해탈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잘려진 나무의 등걸에서 작은 푸른 잎새를 싹 틔우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잃고 텅 빈 것이 아니라 계속 비우고 채워지는 과정, 즉 순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문제는 그 이룬 것들을 부족하다며 인정하려 들지 않고 남들이 맺은 결실을 빼앗지 못해 안달하는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 있다.
제는 인간의 열등의식으로 자신의 숨겨진 본성의 악한 모습이 '나(我)' '무(無)' 즉 '나는 없는 존재'라고 강변하는 나무에게 조차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자백하자. 상처받아 절망하고 분노가 치미는 시간과 어쩌다 찾아올 즐거움의 조각조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무처럼 끊임없이 무념무상(無念無想)의 비우는 연습만 하자. '언젠가는'이라는 단서는 필요 없다. 그 따위 불필요한 희망 고문은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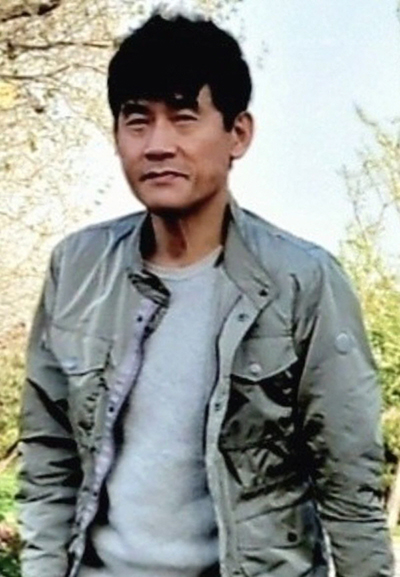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갈구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인간의 손이 자꾸 쥐려고 하는 모양인 것은 그만큼 비우려는 것보다 손에 움켜쥐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배려하려고 두 손을 위로 펴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한사코 손을 접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증명이 되고 있다. 남에게 선의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내 육신이 더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 반란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성프란시스』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사들과 만찬을 즐길 때 음식에 재를 뿌리며 한 말이다. 내 몸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성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인간의 쾌락’에 스스로 재를 뿌리고 있다.'나무처럼 살아야지 / 나(我) 무(無) / 비우지 않고 무엇을 채우려 하나 // 마지막 잎새 떨군 앙상한 몸 / 비로소 해탈이 가능하거늘 // 버려야지 / 양지에만 있는 심목(心目) / 언젠가는 미혹에 눈멀텐데 // 현혹시키는 뛰어난 재명(才名)에 / 세간 인심 요지부동이나 // 인명재천의 요절은 불시의 일 // 나무처럼 살아야지 / 나무(我無)처럼' 필자의 시 '나무처럼 살아야지'는 비움의 진리를 나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또 다른 시 ' 나무와 나'에서는 언제나 맨몸인 채 그대로 은근한 소박함이 눈부신 나무와 헐벗은 영혼은 방치한 채 매일 의복으로 치장하는 나를 자책하고 있으며, 아무리 모진 강풍이 몰아쳐도 부러질지언정 부화뇌동하지 않는 나무와 한시도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벼이 떠도는 경망스러운 나를 적나라하게 비교하고 있다.'나무는 남의 탓을 하지않는다 / 시들어 아스러질 상황에도 / 초록의 꿈을 뒤로한 채 / 홀로 묵묵히 감수하여 / 화석처럼 응달에 침묵할 뿐이다 / 툭하면 제 잘난 듯 / 주위에 원망을 쏟아내는 나는 / 얼마나 이기적인가 / (하략)' 이 시는 곧 초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지금 힘들다고 절망하는 필자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초록도 언젠가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기에 사실은 그 의미도 극히 제한적이다.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에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왜 나무를 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은혜를 모르는 배신에 치를 떨지도 모를 나무는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또 몸이 베어져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죽어서도 세상에 토막 난 자신의 몸과 더욱 은은한 향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을까. 그렇게 배신은 철저히 인간의 몫이고 전유물이다. 그렇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나무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상략) / 제 자리 가만히 서서 / 그늘 만들어 주던 나무에 / 선(善)으로 위장한 미소로 속 감추고 / 허세 부리던 광인(狂人)이 / 날선 도끼를 연신 찍어댔다 // 나무는 고통에 신음하며 / "맘껏 찍어라 / 그러면 나는 너의 광기에 관용을 보여 주마" // 광인은 찍어도 찍어도 쓰러지지 않자 / 제 풀에 지친 나머지 /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 필자의 시 '나무 찍기'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일침을 가하는 시다.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또한 뜻대로 잘 되었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내일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막연한 예측일 뿐이다. 그저 다 비우고 덤덤하게 살아갈 뿐이다. 내일이면 날선 도끼와 전기톱에 허리가 잘리울지도 모르는 나무도 저토록 의연하지 않은가.불교에서의 무(無)와 유교에서 무위(無爲)는 변화와 해탈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잘려진 나무의 등걸에서 작은 푸른 잎새를 싹 틔우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잃고 텅 빈 것이 아니라 계속 비우고 채워지는 과정, 즉 순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문제는 그 이룬 것들을 부족하다며 인정하려 들지 않고 남들이 맺은 결실을 빼앗지 못해 안달하는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 있다.제는 인간의 열등의식으로 자신의 숨겨진 본성의 악한 모습이 '나(我)' '무(無)' 즉 '나는 없는 존재'라고 강변하는 나무에게 조차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자백하자. 상처받아 절망하고 분노가 치미는 시간과 어쩌다 찾아올 즐거움의 조각조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무처럼 끊임없이 무념무상(無念無想)의 비우는 연습만 하자. '언젠가는'이라는 단서는 필요 없다. 그 따위 불필요한 희망 고문은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갈구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인간의 손이 자꾸 쥐려고 하는 모양인 것은 그만큼 비우려는 것보다 손에 움켜쥐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배려하려고 두 손을 위로 펴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한사코 손을 접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증명이 되고 있다. 남에게 선의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내 육신이 더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 반란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성프란시스』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사들과 만찬을 즐길 때 음식에 재를 뿌리며 한 말이다. 내 몸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성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인간의 쾌락’에 스스로 재를 뿌리고 있다.'나무처럼 살아야지 / 나(我) 무(無) / 비우지 않고 무엇을 채우려 하나 // 마지막 잎새 떨군 앙상한 몸 / 비로소 해탈이 가능하거늘 // 버려야지 / 양지에만 있는 심목(心目) / 언젠가는 미혹에 눈멀텐데 // 현혹시키는 뛰어난 재명(才名)에 / 세간 인심 요지부동이나 // 인명재천의 요절은 불시의 일 // 나무처럼 살아야지 / 나무(我無)처럼' 필자의 시 '나무처럼 살아야지'는 비움의 진리를 나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또 다른 시 ' 나무와 나'에서는 언제나 맨몸인 채 그대로 은근한 소박함이 눈부신 나무와 헐벗은 영혼은 방치한 채 매일 의복으로 치장하는 나를 자책하고 있으며, 아무리 모진 강풍이 몰아쳐도 부러질지언정 부화뇌동하지 않는 나무와 한시도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벼이 떠도는 경망스러운 나를 적나라하게 비교하고 있다.'나무는 남의 탓을 하지않는다 / 시들어 아스러질 상황에도 / 초록의 꿈을 뒤로한 채 / 홀로 묵묵히 감수하여 / 화석처럼 응달에 침묵할 뿐이다 / 툭하면 제 잘난 듯 / 주위에 원망을 쏟아내는 나는 / 얼마나 이기적인가 / (하략)' 이 시는 곧 초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지금 힘들다고 절망하는 필자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초록도 언젠가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기에 사실은 그 의미도 극히 제한적이다.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에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왜 나무를 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은혜를 모르는 배신에 치를 떨지도 모를 나무는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또 몸이 베어져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죽어서도 세상에 토막 난 자신의 몸과 더욱 은은한 향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을까. 그렇게 배신은 철저히 인간의 몫이고 전유물이다. 그렇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나무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상략) / 제 자리 가만히 서서 / 그늘 만들어 주던 나무에 / 선(善)으로 위장한 미소로 속 감추고 / 허세 부리던 광인(狂人)이 / 날선 도끼를 연신 찍어댔다 // 나무는 고통에 신음하며 / "맘껏 찍어라 / 그러면 나는 너의 광기에 관용을 보여 주마" // 광인은 찍어도 찍어도 쓰러지지 않자 / 제 풀에 지친 나머지 /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 필자의 시 '나무 찍기'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일침을 가하는 시다.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또한 뜻대로 잘 되었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내일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막연한 예측일 뿐이다. 그저 다 비우고 덤덤하게 살아갈 뿐이다. 내일이면 날선 도끼와 전기톱에 허리가 잘리울지도 모르는 나무도 저토록 의연하지 않은가.불교에서의 무(無)와 유교에서 무위(無爲)는 변화와 해탈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잘려진 나무의 등걸에서 작은 푸른 잎새를 싹 틔우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잃고 텅 빈 것이 아니라 계속 비우고 채워지는 과정, 즉 순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문제는 그 이룬 것들을 부족하다며 인정하려 들지 않고 남들이 맺은 결실을 빼앗지 못해 안달하는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 있다.제는 인간의 열등의식으로 자신의 숨겨진 본성의 악한 모습이 '나(我)' '무(無)' 즉 '나는 없는 존재'라고 강변하는 나무에게 조차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자백하자. 상처받아 절망하고 분노가 치미는 시간과 어쩌다 찾아올 즐거움의 조각조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무처럼 끊임없이 무념무상(無念無想)의 비우는 연습만 하자. '언젠가는'이라는 단서는 필요 없다. 그 따위 불필요한 희망 고문은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